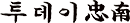예부터 전해오는 예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다. 살아있을 때는 못죽여서 안달이고 죽고 나면 아름답다 칭찬한다는 말이다(生卽欲殺之死後方稱美).
이 말은 오늘날에도 어느 정도 부합하는 말인 듯싶다.
오늘을 살지 않고 내일을 살고자 하는 예인들의 부운(浮雲)에 대한 이보다 적당한 말은 없는 듯하다.
아래의 시를 지은 시인들도 대부분 불우한 삶을 살다간 조선시대 사람들인데 그들이 주목한 여인들의 남성관이 주목을 끈다.풀썩풀썩 이부자리 걷어치우고 옷을 챙기고 닭울음 소리에 길을 나서지요.
문을 열고 내 배를 살짝 만지면서 애는 들어섯나 묻지요.
[索索郞被衣.鷄鳴嗔不休.去時摩儂腹. 晴問懷子不.]
'시경'의 환생인 이 시는 사랑 받는 한 여인의 따뜻하고 행복한 내면이 독자들까지 행복하고 웃음을 짓게 만든다.
기생으로 하룻밤 남자의 풋사랑을 받은 듯한데도 여인은 행복해 보인다. 그런데 남자의 집에서는 기생집을 다녀온 남편을 마음 졸이며 기다리던 여인이 울고 있다.
당신은 술집에서 왔노라 하시지만 나는 창녀집에서 온 걸 안답니다. 어찌 한삼모시에 연지가 꽃마냥 찍혀 있나요.
[歡言自酒家. 儂言自娼家. 如向汗杉上.臙脂梁作花.]
위이 두 시가 시공간이 다르고 작자 또한 다르지만 사랑받고 질투하는 여인의 본능적인 마음은 한가지임이 같다.
그런데 남자들의 이런 행태에 화를 내는 여인도 있어 충격을 준다.
사람들은 긴 겨울밤을 말하지만 나는 따뜻한 봄날이 좋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 사내 마다치 않고 즐겨볼래요.
[人言冬夜永. 儂道春晝舒.從朝向薄暮.十郞歡有餘.]
이런 마음과 결심을 한 여인이 있었다는 것이 놀랍고 한편으로는 이해도 된다.
날마다 기생집을 전전하며 허랑방탕한 남편에 대한 반란으로 이런 꿈 한 번 못꾸어 본다면 그게 사람 사는 일이겠나. 하여 한 걸음 더 나간 시도 있다.
님에게 바둑 한판 청합니다.
한판에 옷이나 몸뚱이는 어떻습니까
해지는 밤부터 해뜨는 아침까지도 좋지요.
꿈인듯 아닌 듯한 사이에.
(君請一局碁 賭販衣又身 好日落日出 間非夢混夢.)
위의 시들은 생삽(生澁) 즉 날것 그대로의 모습이라 더 마음에 다가온다. 문득 이 새벽 평정을 잃을 때 세상은 운다(物不得其平則鳴)'는 말이 있다. 예산에 살던 조선의 여류시인 강정일당의 시를 읽다가 떠오른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