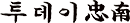천영각에 십여 일째 묵고 있던 김려를 관에서 불렀다. 부사 유상량이었다. 유상량은 노론의 일파로 부령부사로 오기 전 의금부와 포도청에서 4품관을 지내다가 3품관 외직으로 나와 포도대장으로 금의환양하는 꿈을 꾸는 인물이었다.
"죄인이 유배지에 와 있으면 죽은 듯 있어야 하거늘 아직 석갈도 벗지 못한 몸으로 방종을 떨다니 말이 되느나?"
유상량이 짐짓 보루에 기대고 앉아 거만을 떨었다. 석갈(釋褐)은 베옷으로 아직 벼슬길에 나서지 못한 유생을 말한다.
"부사? 비록 죄인이기는 하나 유생을 욕보이는 것은 과하다고 봅니다."
"뭐시? 과하다고?"
김려와 유상령의 첫 대면이 불꽃을 튀겼다. 유상량은 김려와 같은 노론으로 유상량의 마음먹기 따라 같은 동지도 될 수 있는 사이었다. 그러나 유상량은 김려와 동지애를 나눌 마음이 전혀 없었다.
"과하지요."
"흐흐 거자가아가 따로 없군?"
"부사?"
김려가 핏대를 세우며 반문을 했다. '거자가아(渠者可兒)'란 말은 싸가지 없는 놈이란 말이다.
'니놈이 성균관을 함께 나온 동문 사이를 들먹이는 것이냐? 사관 출신인 나와 일개 유생인 니놈이 같이 놀자는 것이냐?"
유상량이 사관(四館)을 들먹였다. '사관'은 조선 관원들의 엘리트 중의 엘리트 코스라할 수 있는 승문관, 예문관, 교서관, 성균관을 말하는 것으로 문과 급제자만이 부임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이 홍문관 승정원과 더불어 조선 관원의 출세의 필수 코스였다.
이 여섯 곳의 관직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당상관(3품관)에 오르기 힘든 것이 조선의 관직이다. 조선의 관원들은 관원이라 하여 다 같은 관원이 아니었다. 문과 음과 천거 무과 등으로 출발하는 관원 세계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차별과 갈등이 존재했던 것이다.
"부사께서는 지금 사관 출신임을 자랑하려 나를 부르신 것이오이까?"
"험, 말인즉 그렇다는 것이다. 죄인 신분으로 기생집에 거처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속히 나와 김명세의 집으로 옯기거라."
유상량이 김려의 거처를 지적했다.
"기생집이 아니고 천영각에 붙은 별채에 방 하나를 얻어 기거하는 것입니다. 법도를 어긴 것이 아닌줄 압니다만."
김려가 법을 들어 말했다. 조선의 유배자는 '위리안치' 같은 중죄인을 제외하곤 유배지에서의 생활이 자유로웠다. 거처와 식생활은 물론 경제력이 있는 죄인은 아내까지 대동해 살 수도 있었다. 문제는 가난한 유배자들이었다. 가난한 유배자들은 해당 관에서 먹고 살 대책을 강구해 주는데 그 방법이 졸렬하고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다산 정약용도 장기에 귀양을 갔을 때 한 주막을 배정받았는데 늙은 주모의 눈치가 장난(?)이 아니었다.
"천영각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니놈을 불량 죄인으로 상소를 올리겠다. 괜찮겠는냐?"
유상량이 겁박을 하고 나왔다. 김려는 이해를 할 수 없었다. 별다른 원한이나 사적 감정도 없는 유상량이 저렇게 심술로 나오는 이유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천영각이 문제라면 나오겠소이다. 다만 거처는 내가 정하겠소이다."
"안 된다. 김명세 집이 좋다. 그리로 옮기거라."
유상량이 김명세의 집을 고집했다. 김명세만이 김려를 골탕 먹일 수 있다는 것일까.
"부사?"
"시끄럽다. 오늘 중으로 옮기지 않으면 상소를 올리겠다. 가봐라."
"부사?"
"가보라니까 그런다?"
김려는 내쳐지듯 관아를 나왔다. 분통이 터질 일이었다. 죄인의 신분으로 조정의 상소전에서 김려가 이익을 볼 일은 거의 없었다. 유상량이 믿는 것도 그것이었다.
저작권자 © 투데이충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