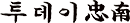어젯밤에 비 내리고 적막강산에 신선을 만나 바둑을 두었고
오늘밤은 달 밝기에 초당에 이태백 만나 말술을 들이키며
시 백 수를 지었다.
내일은 두릉의 호걸 '두보'와 '한단'의 기녀들을 만나
실컷 놀며 '대모꼬지'나 하여를 볼까
(남원고사 왈자의 노래)
양천봉의 접대는 살가웠다. 양천봉은 김려를 '천영각'으로 모셔가 자신의 죽은 큰형이 살아 돌아온 듯 알뜰살뜰 챙겼다.
"형님, 이거 한점 드시지요?"
"고맙네."
"고맙기는요. 이것도 한점 드시고요?"
양천봉은 젓가락으로 이것저것 반찬을 집어 김려의 수저 위에 올려주며 아예 기생수발을 자처했다. 옆에는 천영각의 주인인 '연희'가 앉아 있었다.
"허허...."
"형님, 아우는 초정 형님의 당부를 따를 뿐입니다. 이 서찰에 천항의 인재니 나를 대하듯 해주시게 하셨으니 형님은 곧 초정형님이십니다."
양천봉이 소매 속에서 서찰을 꺼내 보이며 너스레를 떨었다.
"호호. 양기위께서는 너무 하시이다. 소녀가 퇴기라 하여 이리 통성명도 못하니이까?"
연희가 양천봉과 김려의 사이를 끼어 들었다. 상위에 빈술병이 하나 나올 때까지 연희는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오, 연화보살 소개를 까먹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 사람이 바로 관북의 '이청조'라는 사람입니다. 형님 인사 받으시지요?"
양천봉이 그때서야 연희가 옆에 있음을 알고 김려에게 인사를 시켰다. 삼십 초반의 여자였다. 키는 작고 몸집은 아담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조금 훗날 김려가 조선의 '왕소군'이라 평한 당대의 여류시인이었다.
苦雨長夏漲溪漩 유월 긴긴 장마비 개울은 넘쳐나고
五日不覿蓮姬面 오일이나 연희 얼굴을 보질 못했네.
今宵雨歇月在沙 이밤 비개고 달은 모래 밭에 떠올라
水邊楊柳漾綠紗 물가 버드나무 푸른 가지 출렁이네.
竹笻麻鞋出溪上 대지팡이 집신 신고 개울가에 나가
信步擬往蓮姬家 발 가는 대로 걸어서 연희집 가고파.
忽見沙際無限樹 모래벌판 가엔 많은 나무들 보이고
樹梢微動人影度 가지 흔들려 사람 그림자 지나가네.
短傘布裙提葫蘆 짧은 우산 무명치마 조롱물 들고서
蓮姬已踏橋西路 연희 벌써 다리 서쪽 길 마중나오네.
(김려사부악부)
"소녀 연희입니다."
"김려요. 죄인의 신분으로 교방의 인사를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구료."
김려는 교방'이라 말했다. 교방은 기생집을 가르키는 말이다.
"교방은 본래 울울한 사람들을 위해 있는 것 아닌지요. 다만 계시는 동안 마음을 잠깐 내려놓기를 청할 뿐이지요."
"......!'
김려는 연희의 식견을 단박에 알아 보았다. 고운 눈길과 따뜻한 음성이 곧바로 아름다운 시를 토해 놓을 듯했다.
"하하하, 형님 앞으로 여기 계시는 동안 연희보살과 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우가 형수님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어허, 이 사람?"
"양기위께서 너무 나가시는 거 아닌지요?"
"하하하."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방안을 진동했다. 옆방에서 한상을 독상으로 받고 허겁지겁 주린 배를 채우던 위서방도 그 소리를 듣고 절로 기분이 좋은 모양이었다. 눈이 계속 내려 길을 막을 정도였다. 위서방은 돌아가는 길이 겁나 방안에 청을 넣는다.
"나으리 밤이 너무 늦었고 길은 눈길이옵니다."
위서방은 악질인 김명세의 횡포가 겁이 났다. 집을 비운 것을 빌미로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작자였기 때문이다.
"그 점은 걱정마시게. 명세도 오늘 밤일은 시비삼지 않을 게야. 걱정마시고 실컷 드시게나. 하하하."
양천봉은 위서방의 걱정을 덜어주며 호탕하게 웃었다. 김려도 그 소리를 듣고서야 허리띠를 풀 수가 있엇다. 연희가 노래 한자락을 풀어 놓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