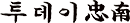[투데이충남/석용현 논설위원] "달마의 눈꺼풀"을 통해 하재일 시인은 독자와의 소통을 생각하는 시집을 출간하고 싶었다고 한다. 시는 심오한 것,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독자와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독자와 대화가 안 되는 시는 소통에 문제가 있다. 요즘 양산되는 대부분의 시를 일러 단지 말 잔치일 뿐이라고 비판하는 독자들이 많다. 대화가 안 되는 난해한 시가 덮어놓고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원칙적으로 독자와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이다.
따라서 시를 읽으면 인간이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어야 하고, 동시대 시인이라면 어떻게 사는가를 발견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말의 성격에 맞는 아름다움을 잘 살린 시를 창작하고 싶었다고 하 시인은 말한다.
하시인은 주변의 비근한 것에서 시의 소재를 찾고, 관념적인 것을 멀리하고 생활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경험에서 글감을 찾고자 했단다. 다소 미소(微小)하다는 특징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거창하게 떠들거나 큰소리치지 않으며, 일상에서 길어 올린 사소한 소재로 독자에게 울림이 가능한 이미지의 세계를 구축하고자 접근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럭젓국, 수박, 꽃게, 회화나무, 짜장면, 비린내, 도시 변두리 장터 풍경 등등.
일상적이면서도 작고 하찮은 사물들의 세계를 시로 형상화시켜 보여주고, 시적 관심을 동네 주변에 산재해 있는 가까운 이웃과 사물들의 존재상, 진경(眞景) 등을 산책길에서 만나 그들과 대화하며 사유를 통해 역지사지하는 세계를 작품으로 그려 보고 싶었다는 <달마의 눈꺼풀> 시집의 의미를 말하고 있다.
"달마의 눈꺼풀"이라는 작품을 요약하면, 구체적 경험 속에서 발원하는 귀납의 세계다. 시인 자신이 살아오면서 마주쳤던 비루한 외곽성의 세계를 진정성 있게 노래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특징은 여러 시편에서 눈에 띌 것이며 차이는 있지만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간혹 시편들이 보여주는 파격, 비약, 돌발, 낯설고 투박한 모습들은 생물과 무생물, 인간과 미물은 물론이거니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간에 차별 없이 일체 만물을 겸허하게 포용하는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 고요히 멈춰 서서 대상과 관계 맺기를 하고, 사물과 대화하고, 그의 입장에 서 보고, 일상과 다른 각도에서 그를 만나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달마의 눈꺼풀"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부 ‘사막에서 사는 법’ 외 14편, 2부 ‘연기’ 외 14편, 3부 ‘동쪽 버드나무 아래서’ 외 13편, 4부 ‘빙도를 아시냐요’ 외 13편(총 58편). 구성의 기준은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창작한 시기와 발표 연대를 따라서 배열하고 형식이 짧은 시와 긴 시, 구체성과 추상성, 대중성과 고유성, 시적인 난이도 등을 적절하게 고려해 배치하고 있다.
이 시집의 혈액형은 머나먼 우주여행을 떠나는 유목민이다. 시간 속에서 생성되고 소멸되는 존재에 대한 측은지심이 도처에 깔려 있으며, 시인은 물고기자리에서 태어났지만, 다시 불멸을 꿈꾸며 밤하늘의 별자리로 돌아가는 중의 느낌, "달마의 눈꺼풀"이란 제목은 차(茶)의 기원에서 붙잡게 되었다고 한다. 면벽 참선을 하던 중 졸음이 쏟아지자 달마는 칼로 눈꺼풀을 잘라내 마당에 던져버리고, 눈꺼풀은 땅에 떨어져 풀잎이 돋고 차(茶)나무가 되어, 세계의 고통을 이겨내고 현상을 똑바로 보려는 시인의 간절함이 이 시집에 담겨있다. 녹차 한 잔의 의미를 되새기며, 시에 대한 용맹정진의 결의를 다잡아 보면서 길은 언제나 꿈에서 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상이 짙게 깔린 한폭의 수채화 그림 같은 시집이다.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길목에서,
달마의 눈꺼풀 중, 천수만을 옮겨 보다.
● '나의 갠지스, 천수만'/ 하재일
겨울 철새의 새오름이 하늘로 솟구치는 천수만 상펄은
조금 사리가 뒤바뀌는, 달이 태어난 바다의 배꼽이다.
라텍스 피부를 가진 바닷물이 양수처럼 가득 차오르는
천수만은 원래 초승달에 생일로 태어났지만
천 개의 연꽃잎을 어둠에 감추고 매일 밤 한 장씩만 떼어서
유백색 둥근 얼굴로 바다의 장지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다.
장대 키를 훌쩍 넘긴 달빛이 머리를 산발하고 옆구리에 물 항아리를 둘러멨다.
항아리에서 연신 국자로 물을 퍼 수량을 조절하며 부드러운 입김으로
바람을 불러 체에 모래를 곱게 거른다
비옥한 여신의 보름사리.
주름잡힌 달의 옆구리에 밀물 들면
바다는 살과 살이 맞닿은 강줄기의 안주머니 깊숙이 가죽 지갑 속에
외씨를 심듯 패류의 꿈을 꼭꼭 숨겨 둔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은밀한 밤에 섬들이 토한
잠 덜 깬 모시조개의 탯줄을 받아내며
밤마다 천수만에 뜨는 바르한의 초승달은
별과 바람과 노을을 통해 모든 생명을 제각각 길러 낸다.
그중 세 번째 통로인 상현달은 하늘의 미간에 위치해 있기에
생각이 너무 무거워 차라리 눈을 감고 있다가,
결국 밝은 해를 보지 못하고 섬이 만든 캄캄한 그리움 속에서
바다의 음성을 겨우 매만지다 어둠의 동공에 투신했다
두 갈래의 길로 빛이 새어 나와 다시 불꽃을 만들어 낸다.
놋쇠로 만든 폭풍의 삼지창을 미풍에 삭힌 다음 남게 되는
그날그날의 불 꺼진 재는 바다의 지붕 위에 낙조로 흩뿌려져
주꾸미와 새조개를 기른 양막에 오래 유등으로 흘러 부활한다.
철새 울음이 쌍발 썰매를 끌고 온 겨울,
찾아온 새들이 하늘이 내준 빈 관절 하나를 입에 물 때
석화는 혹한을 털모자를 짜 머리에 쓰고 살을 채운다.
이때 바다에 가득 찬 달빛은
눈발이 날아와 앉았던 느린 염기를 활활 태워
우둔한 결빙을 온몸으로 버티며 건너가고
햇살이 내려앉는 대낮엔 집게발을 높이 쳐든 황발이가
앞마당 갯벌 가득 떼를 이루어 양귀비 꽃밭을 일군다.
붉은 만다라를 게들이 연신 비눗방울처럼 퐁퐁 게워 내며
경건하게 강심을 향해 오체투지하는 순간,
붉은 구름은 반들반들한 썰물을 하루 종일 멍석처럼 말고 갔다
다시 가볍게 밖으로 펼치고 나온다
천수만엔 낮과 밤을 지피는 파도의 키에 맞춰
무려 삼억 삼천의 달빛이 퍼뜨린 물고기들이 이웃하며 산다.
밤마다 그들은 마른 나문재 가지로 어둠을 먹물로 찍어
풍요를 비는 색색의 타르초를 상형문자로 새긴 다음,
해 질 녘 가창오리 떼의 길게 목 뺀 울음소리에
마지막 햇살을 얹어 광목천으로 펼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