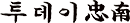[충남투데이 / 이청 논설위원] 기록을 뒤진다. 요즘은 순장바둑의 상한 연도에 대한 단서를 찾아 새벽을 밝히는 일이 잦다. 권경언 선생이 처음 기록한 최석신의 배자(配子)보다 앞선 기록을 찾는 것이 목적이지만 여의치 않다. 최석신은 중종연간의 사람인데 나는 수년전 같은 시대 사람인 미암 유희춘의 글에서 순장식 배자를 말하는 이 글귀를 발견한 적이 있을 뿐이다.
벌여 놓은 팔진에 바람과 천둥이 대치하듯 한 순간을 노래한 (誰排八陣動雷風) 구절이다.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나는 '성산월'을 생각한다. 옛날 조선의 군왕 중에 바둑을 한 신하에게 물어본 군왕이 있었다.
"바둑이 무엇이냐?"
"네에...?"
"너는 바둑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물었다."
군왕이 자리를 고쳐 앉으며 물었다. 군왕의 모습은 여유가 넘쳤고 눈길을 따뜻했다. 신하가 대답을 했다.
"전하, 바둑은 숭례문 바깥의 멍충맞은 서생이 아닐는지요?"
"뭐라? 니가 야담을 하자는 거는 아닐게고... 오라? 하하하. 그래 너의 말도 일리가 있구나."
"황공하옵니다."
신하가 고개를 숙이고 대답을 했다. 군왕이 배꼽을 잡고 웃다가 말을 이었다.
"하하하, 그래 바둑은 성산월이다. 성산월이고 말고. 아하하...!"
군왕이 호탕하게 웃으며 바둑판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군왕의 손길은 바둑판의 오랜 연륜을 느끼기라도 하는 듯 조심스러웠다. 신하가 말하고 군왕이 이름을 특정한 성산월(星山月)은 '어유야담'에 전하는 천하절색의 기생을 말한다. 이 성산월이 어느날 유회에 불려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큰비를 만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돌아오는 길에 큰비를 만났다. 소매와 치맛단이 반쯤 물에 젖었다. 남대문 밖에 도착하자 시간이 늦어 성문이 닫혔다. (성산월은) 주변을 살펴보았다. 근처 연못 근처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는 집이 보였다. 그 안에서 책을 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창틈으로 보니 서생이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성산월은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서생을 불렀다. 서생이 놀라면서 창가로 와 묻는다. 성산월이 말했다. 자기는 기생으로 주연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비를 만났고 너무 늦어 묵을 곳이 없으니 청컨대 서생의 책상 앞 한쪽이라도 내주면 있다가 가겠노라 말한다. 서생은 성산월의 아름다운 얼굴과 울긋불긋 화려한 옷을 보고 크게 놀라며 소리를 친다.
"어찌 이리 누추한 곳을 찾아 잠자를 청하느냐? 너는 필시 요물일 터...썩 물럿거라."
서생의 버럭질과 손가락질을 받고 성산월이 대꾸를 한다.
"아이고 서생아? 대명천지에서 니가 나를 어찌 보겠느냐? 불행하게 큰비를 만나 잠자리를 구걸하듯 청하거늘 굴러온 떡을 걷어차니 이 지지리도 복 없는 인간아?" (주1 . 어우야담 중)
"그렇지, 바둑은 멍충맞은 서생에게는 성산월이지. 하하 그 말 한번 과연이로다."
군왕은 신하를 흥미로운 눈길로 바라보며 즐거워했다. 안으로는 모두 바둑을 즐기면서도, 입으로는 잡기를 운운하며 바둑을 지탄하는 세상의 풍토를 단순명료하게 설명하는 신하의 임기응변이 절묘했다. 좋은 임기응변도 인재의 덕목이었다. 군왕은 항상 시대의 인재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었다.
"말이 나온 김에 바둑을 화제로 시 한수를 짓거라. 시가 좋다면 상을 주리라."
"전하...?"
"선비는 언제나 묵향과 함께 하는 법. 하여 때가 되면 하겠다는 것도 기약 없는 짓이니라. 자..."
군왕이 신하의 서안(書案 ) 위에 가지런히 놓인 문방사우를 지목하며 시짓기를 청했다. 신하는 머리를 조아리고 종이를 펴고 먹물을 붓에 찍었다. 그리고 시 한 수를 써 내려갔다.
조용한 친구와 바둑판 마주하고
깊은 밤이면 시 한수를 읊네.
무릉도원만 별천지라 하리오.
한가한 이곳도 그 못지 않도다.
(김려)
얼마전 성주가 난리였다. 성주기생 성산월 그 여자가 지금 세상에 많은 이야기를 들려 주고 있다.
주1. 어유야담 성산월조. 途中逢大雨 翠袖半濕 步到崇禮門己鑰矣. 回睇蓮塘西岸 有川窓照燈 窓內有讀書聲 完窓而점 卽少年書生也 我低聲馨咳 輕手叩窓 書生宿然傾聽 我曰 余城中妓 逃酒遇雨 無居寄宿 請榻下尺之經夕 書生拓窓 見粉面佳姬 衣裳容色俱絶麗大驚意謂 如此絶麗 豈有自投寒生而宿 必是妖魅 輒牢曰 彈指大祝曰 何物怪魅敢來眩人耶. 哀栽邇書生 邀我於靑天明月 我肯顧邇乎 不幸値雨 哀聲乞宿 而反不余許 邇眞寡福男子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