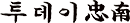“요즘에는 투전판 건사가 일인가?”
홍경래가 김견신을 바라보며 말했다. 방안에서는 간헐적인 신음이 들렸고 느릿느릿 바둑통에서 바둑알을 딸그락 거리는 소리와 화음을 이루었다.
“그나마 쩐내라도 맡을 곳은 이것뿐“아니가? 저 물건 한번 울궈먹으려 했더니 경래 자네가 함께 올 줄 몰랐네.”
김견신이 침을 땅바닥에 뱉으며 말했다. 행동거지가 영락없는 왈패였다.
“자네 많이 변했군? 한때는 선비가 되겠다고 청태(靑苔)같이 푸르더니 말이야.”
“하하, 그랬지. 그때 자네와 함께 사마시를 보던 때만 해도 그랬어.”
홍경래와 김견신은 정조 13년에 있었던 사마시에 응시를 한 적이 있었다. 사마시는 증광시 식년시와 더불어 조선의 3대 과거였다. 과거는 조선의 젊은이들의 꿈이자 의미였다. 과거를 통해 입신양명을 하려는 조선의 선비들은 산림을 이루고 산맥을 이루어 체제의 순기능을 해왔다. 그러나 조선의 과거제도는 후기로 오면서 온갖 부정과 반칙으로 얼룩이 지고 있었다.
영정조 시대라 하여 별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고질이 된 과거제도는 영민한 왕인 영정조도 속수무책이었다.
“그때 한번에 포기하지 말고 몇번 더 응시할 걸 그랬나봐. 자네는 여건이 되었잖아.”
홍경래가 상대적으로 가산이 넉넉했던 김견신에게 물었다.
“조정대신들이나 하다못해 당일 시험관에게 뇌물이라도 주어야 하는데 그 액수가 만만치 않지 않은가?"
“무과는 급제를 했다면서?”
“하하, 난만(蘭漫) 무과? 그게 장난이지 온전한 것인가?”
김견신이 코웃음을 쳤다. 조선 후기로 오면서 급격하게 품위가 떨어진 과거제도는 무과에서 난만(어지러운 바둑판)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다. 연중 온갖 핑계를 꾸며 수시로 열리는 무과는 한번에 천 명의 급제자를 내고 발령은 나 몰라라 하는 황당무과로 한량들만 양산하고 있었다.
정조는 무과 급제자들을 시험해보고 활도 잡지 못하는 급제자 태반인 것을 보고 입맛을 다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무과는 인기가 있었다. 그만큼 조선 사회에 신분상승에 대한 여망이 있었고 조정은 이런 욕구를 빌미로 명예직의 무과급제자를 양산한 것이다.
영조 50년 평안도에서 있었던 무과에서 응시자만 4만 명이 모여 영조를 졸도(?)시킨 적도 있었고 정조 6년 평양에서 본 무과에도 1만 명의 응시자가 몰릴 정도로 과거에 대한 환상이 있었다.
사가(史家)들은 홍경래의 난의 원인을 서북차별이란 단편적 물음으로 모든 논지를 전개한다.
사가들의 이 연구를 보고 2선 필자들은 온갖 소설과 드라마를 쓴다. 이런 과정에서 지역차별은 홍경래난의 본질이 된다.
그러나 사실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 여기서 조선의 문과 총급제자 목록인 ‘문과방목’에서 정조-철종연간의 급제자들을 살펴보면 평안도출신의 급제자의 수가 경상도 충청도에 비해 적지 않고 무과 급제자는 오히려 평안도가 경기 한양권을 제외한 어떤 곳보다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단초는 순전히 ‘송준호’의 연구에 의해 알려진 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서북차별이란 말이 얼마나 연구가 없는 말인지를 알게 된다.
필자는 조선 8도는 모두 경기 한양권에 대한 차별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말을 하고 싶다.
서북차별이란 말도 이런 상대적 박탈의식에서 나온 말이 아닌가 생각한다. 조선 시대의 한양은 박지원의 소설에 나오는 제맹아적 도시 팽창으로 8도 전체를 능가하는 인적 물적 토대가 구축되었고 이 속에서 상대적 지역 차등이란 말이 나오게 된다. 서북지역에 대한 무차별적인 차별과 무시가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이다.
“하긴, 그렇다 해도 겸신이 자네가 왈짜가 웬 말인가? 검계에서 뭘 얻을 수 있다고?”
“뭐라고? 이봐, 자네나 나나 똑같은 처지야. 이거 왜 이래?”
“똑같은 처지라니?”
“하하, 서북에서 길을 막고 물어보게? 홍경래와 김견신이 뭐하는 작자냐고 말이야?”
“끄응.”
“하하, 이 사람 웃기네. 의주 채단이나 자네의 홍단이 무엇이 다른가 말이야.”
홍경래는 할 말이 없었다. 군도를 이루어 관과 상인들의 이권에 개입하고 지역 부호들을 협박하여 지금을 만드는 방법이 채단의 그것과 다를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판이 어찌 되고 있나 한번 볼까.”
김견신이 방으로 들어가자 선아가 홍경래의 옷소매를 잡아끌었다.
“대장님?”
“뭐냐?”
“저 할아버지 아는 사람이거든요.”
“누구말이냐? 저 바둑 두는 사람 말이냐?”
“네. 정운창. 저 할아버지가 바로 정운창이에요.”
홍경래는 선아의 손을 잡고 마당을 나와 집밖으로 나왔다. 어둠이 더욱 깊어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