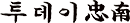탑 너는 어인 까닭으로 세월의 법당을 벗삼아 살아왔던 것이더냐
꽃이 진다. 아름다웠던 날은 없었지만 지는 꽃에 일말의 감정도 없다는 것은 거짓이다.
바람이 세다. 그러나 풀기가 없는 바람은 이미 바람이 아니다. 풀기는 바람의 체온이기에 동토에 잠들었던 온갖 생명의 씨앗들이 정령을 느끼고 움을 트는 거다. 그렇게 봄이 왔는가 싶더니 어느새 꽃이 진다.
탁탁탁.
목탁 소리가 경내를 두드린다.
울림이 있는 박자가 작은 약사전을 돌아나와 그리 넓지 않은 마당 공터에 합장을 하고 서 있는 불자들의 마음속을 통과하여 산곡을 빠져 나가 허공이 된다. 작은 사람의 상반신과 비슷한 약사불이 좌대 위에서 내려지고 좌불의 등뒤에 있는 작은 개폐구가 열리며 붉은 비단 한폭이 꺼내진다.
약사불발원 축원문.
붓으로 쓴 행서가 느럭느럭하다. 주지인 학무(鶴舞)가 발원문을 낭낭하게 읽는다. 문장이 유장하다.
이 세상 어느 곳이나 계셔 모르는 것 없으시니 저 세상 어느 곳에나 계셔 이 세상 저 세상 두루 모르는 것 없으시니, 저저 세상 어느 곳에나 계셔 이 세상 저 세상 살피시고, 저저 세상 보듬으시니. 사생육도(四生六道)를 다스리고 삼도(三途)로 나아가길 바라오니 어둠은 중생의 지혜를 비추오고 춥고 배고픈 중생을 비추오고 전옥소에 갇혀 헤매는 중생 비추오고... 사자의 소리로 떨치고 일어나셔, 대천 번개의 소리로 깨치고 일어나셔...
탁탁-탁!
다시 목탁 소리가 하늘을 울리고 학무의 발원문 읽는 소리가 장단을 넣으며 악(樂)과 무(舞)를 이룬다.
홍경래(洪景來)는 불자들 사이를 빠져나와, 약사전(藥師殿 ) 뒤로 오르는 돌계단을 올라 비로나전을 지나 대웅전으로 향했다.
양화사(壤華寺)는 산곡에 갇힌 작은 사찰이나 영험한 약사불을 모신 덕에 서북지방의 불자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다. 신라시대에 창건되었다는 말은 전하나 확실한 연혁은 모르는 숨겨진 고찰 중 하나다.
홍경래는 대웅전 앞의 3층탑을 돌아 작은 돌무더기가 있는 부근에 자리를 잡고 앉아 앞산을 바라보았다. 첩첩산중의 외로운 절간이었다. 뻐꾹새가 울었다. 산중의 해는 벌써 산을 넘고 있었다. 하늘과 산이 만나는 공제선 위로 붉고 진한 노을의 흔적이 붓으로 한번 쓸고 지나간 듯 기다란 붓선을 남겨 놓고 있었다. 그리고 산그늘이 시작된다.
“응?”
홍경래는 산그늘이 내려오는 탑 옆에 한 소녀가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랐다. 열다섯쯤 되었을까. 낡은 의복에 발가락이 삐져나온 짚신을 신은 아이었다. 아이는 홍경래의 존재를 까마득히 모르고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무엇인가를 쓰고 있었다. 절집에 사는 아이는 아닌 듯했다. 아이가 땅바닥에 쓴 글자는 한문이었다. 초라한 아이의 행색에 비교하면 놀라운 일이었다.
나무사파. 나무관세음.
“이름이 무엇이냐?” 홍경래가 아이의 뒤에 서서 물었다. 아이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다보았다. 그 모습이 잔뜩 풀이 죽은 모습이었다.
“마님이 찾으시는지요?” / “마님이라니 뉘집 종복이더냐?”/ “관아의 종입니다. 마님을 따라왔지요” / “그래? 이름이 무엇이냐?” / “선아입니다. 성은 유가고요” 아이의 이름은 선아(善娥)였다. 유씨로 양반가의 자식이었으나 아버지가 역적죄에 연루되어 박천(博川) 관아의 관노비가 된 신세였다.
“유선아라 좋은 이름이구나. 한양에 살았더냐?” / “... ...”
선아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 두 눈을 꿈벅였다. 금방이라도 눈물을 떨굴 모양새였다.
“얘야. 내가 곤란한 질문을 한 게구나. 그래 이곳에 온 지는 얼마나 되었느냐?” / “3년입니다” / “3년? 관노 생활이 힘들었겠구나. 참아야지 어쩌겠느냐. 그리 살다보면 좋은 날도 오지 않겠느냐”
홍경래는 선아의 초라한 행색만큼이나 그늘진 얼굴 속에서 눈빚이 깊고 맑은 것에 마음이 갔다. 깊은 눈이 왠지 사람의 마음을 끄는 아이였다. 홍경래는 선아의 등짝을 한번 두드려 주고 대웅전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양화사는 약사전 비로사전 대웅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청룡사. 보현사. 칠악사와 함께 서북 사찰(四刹)로 불리고 있는 이유는 대웅전 안에 모셔진 철불 때문이었다.
“저 대장님?” / “응?”
홍경래는 선아가 부르는 말에 깜짝 놀라며 다시 뒤를 돌아보았다. 선아가 홍경래를 알고 있는 모양이었다.
“홍대장님 저를 산채로 대려가 주시면 안될는지요?” / “나를 아는 것이냐?” / “아까 절에 올라올 적에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 “내 이름을 그래서 아는 거이냐?” / “서북의 구름이신 대장님을 왜 모르겠어요? 고된 관아일을 끝내고 언니들과 잠을 자다가도 홍대장님 얘기만 나오면 신이나 잠을 설치곤 했는데요”선아가 두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서북의 구름이라고? 내가 언제 희설이 되었단 말이구나?” / “그럼요. 홍대장님은 목사나 관찰사보다도 힘이 센 분이 아니신가요?” 선아가 희설(戱說)의 다른 말인 구름으로 홍경래를 비유했다. 희설은 소설로 조선후기 가장 인기 있는 문학 장르의 하나기도 했다.
<다음편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