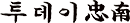지난해 유난히 포근한 겨울이 지속되면서 올봄에 채소 풍년이 들었다.
풍년으로 인해 농부의 얼굴이 밝아야 정상이지만 더 어두워진 것이 현실이다.
너무 잘된 농사는 나만의 상황이 아니라 모든 재배농가가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농산물 가격의 폭락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양파나 대파 무 등 채소의 가격이 폭락하자 산지폐기를 택한 농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농산물을 수확해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보면 생산 원가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상황에서 수확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산지 폐기를 할 바에는 저렴하게 이웃이나 지인들에게 나누어주거나 무상으로 주는 것이 좋지 않냐는 의견도 있지만 이럴 경우 농산물의 가격이 더욱 폭락할 수 있어 이 또한 농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지만 정부의 산지 폐기 보조금 몇 푼으로 씨앗 값이라도 건지는 농부의 안타까운 선택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산지 폐기비용으로 쓰인 예산만 500억 원 넘으면서 애써 키운 자식 같은 농산물을 갈아엎는 농부의 안타까운 마음도 문제지만 정부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 일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채소가격 안정제라는 제도를 통해 정부와 계약재배를 통해 채소가격의 80%를 보장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지만 농가가 재배 물량의 50% 까지 정부 방침에 따라 출하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현재 전체 작물의 10%정도만 계약 재배를 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민의 입장에서는 농협을 통해 출하하는 정부의 납품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된다는 문제를 토로한다.
현지 유통상인이 제시하는 가격대비 농협 납품 단가의 차이가 크다보니 농민의 입장에서는 계약재배에 응하기 쉽지 않고 간간이 농산물 가격 폭등으로 인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속내인 듯 하다.
또한 정부의 수급정책을 대신하는 농협의 입장에서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넉넉하지 않은 예산으로 채소 수급을 공공의 영역에서 통제하기 쉽지 않다.
농협이 나서 채소 수급의 조절에 힘쓴다 하더라도 농산물 가격 폭등기에는 농민들이 계약을 파기하고 유통 상인에게 넘기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인데도 제제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가격이 치솟은 것을 뻔히 아는 상황에서 저렴한 값에 납품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가격이 폭락하면 계약 재배가 아닌 농가들 마저 산지 폐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에 대한 거절 또한 어렵다고 호소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와 농민들 사이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부는 채소의 생산과 유통의 통제 한다는 정부정책의 우산 아래로 더 많은 농민들이 들어오게 하려면 농민과의 대화를 통해 수매 가격의 현실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농민들
이 납득할수 있는 적정 수준의 가격을 제시해 풍년시의 가격 폭락이나 흉년시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농민들은 계약재배의 약속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농산물 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했다고 폭등가격으로 정부가 수매해줄 것을 요구하지 말고 계약 내용대로의 이행에만 집중해야 한다.
정부의 충분한 예산과 농민의 신의성실에 입각한 계약 이행을 통해 채소값 안정을 이룰 때 정부나 농민이나 갈등 없이 본연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다.
올해도 수천, 수만 톤의 양파, 대파, 무들이 밭에서 버려지고 있다.
산지폐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대안이다.
시장에서 물량을 없애면 가격은 맞춰지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이보다 더 큰 낭비는 없다.
산지폐기의 악순환, 그 고리가 끊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농민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