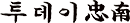사회 구조가 다변화 되면서 생긴 위치중 책임자라는 자리가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책임자이고 장관은 그 부서의 책임자다.
기업에서도 사장은 회사를 책임지는 위치이고 과장은 업무의 한 분야를 책임져야 하는 자리다.
최근 공무원들의 대화 속에 책임이라는 단어를 자주 발견하곤 한다.
새로운 프로젝트나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책임져야 할 일을 왜 하느냐”는 자조석인 말이다.
이는 단어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하는 대화다.
책임이라는 것은 일의 실무자에게 주어지는 족쇄가 아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일한 결과에 대해 기대만큼의 성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져야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책임자는 업무에 대한 계획이나 지시를 통해 담당자가 원활한 업무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며, 부하직원이 최선을 다한 일에 대한 부족한 결과에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본인이 맡은 일에 본인이 책임져야한다는 의식은 젊은 세대들의 업무 기피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함께 일하고 싶은 상사의 경우, 업무 능력이 뛰어난 상사 다음으로 ‘부하직원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는’, ‘전문가·지인 등 인맥이 풍부한’, ‘공정하게 업무를 평가하는(공과 사가 분명한)’, ‘부하직원의 업무적 실수를 책임지고 해결하는’ 상사가 꼽혔다.
최근 공공기관의 업무에서 중간관리자인 팀장(계장)급이 업무 책임자인 경우가 늘어나면서 직원과 팀장 그리고 부서 책임자인 과장(실장)의 모호한 관계가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의견도 다반사다.
업무관련성이 없는 직렬의 관리자는 업무에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을 모르는 책임자의 관리가 업무를 책임지는 팀장이나 직원의 실수에 관대할리는 만무하다.
그러다 보니 업무 배정 단계에서부터 잡음이 생기게 되고 그러한 과정의 반복은 결국 업무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적재적소란 말을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공직사회에서 적재적소에 맞는 인사를 찾아보기 어렵다.
일정한 직위(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사무관)에 오르면 자신의 분야와는 상관없는 실과에 부서장으로 발령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경우 모르는 업무에 대해 팀장이나 담당들에게 일을 배우는 기간이 소요되고 겨우 일을 다 배우고 나면 다른 부서의 부서장으로 이동해 버린다.
환경을 모르는 환경과장이나 산림을 모르는 녹지과장이 오면 직원들은 업무를 가르치느라 본인의 빠듯한 업무시간을 쪼갤 수밖에 없다. 또한 업무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업무에 대한 분담 등을 정할 때도 애를 먹는 것은 다반사다.
또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 또한 다르다.
업무나 직렬의 선배로써 후배들의 애로사항이나 노력한 부분에 대한 인정 자체가 어렵다 보니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만족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선 담당자들의 책임으로 돌리기 일쑤다.
책임자의 자리에 대한 무게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일하고 싶은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지역이 발전하고 자치단체에 속한 주민들의 행복과 안전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다.
고등학교시절 체육관 선배들의 말이 생각난다. “니들 맘대로 다 해봐. 후회를 남기지 마라. 책임은 우리(형들)가 진다”
공직사회에서 그런 선배들의 시원한 사이다 같은 말 한마디가 간절히 기다려지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