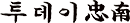다행히도 귀국에서는 과체(瓜滯)를 생각하지 않고서 다만 환호(驩好)만 소중하게 여겨 공사를 거듭 파견하여 며칠 안에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다시 관약(款約)을 맺었으니 이는 실로 두 나라의 불행 중의 다행입니다. 폐방이 처음에는 겸연쩍게 여겼으나 종말에는 감동하여 귀국이 이웃 나라와 의좋게 지내는 지극한 뜻을 깊이 인식하여 말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흉도(兇徒) 정완린(鄭完隣) 등 11명은 이미 체포하여 사형에 처하였고, 손순길(孫順吉) 등 3명은 잇따라 잡아서 즉시 효수(梟首)하여 뭇사람에게 보였으며, 이진학(李辰學) 등 3명은 범죄의 정상이 조금 가벼웠으나 모두 엄벌에 처하여 먼 곳으로 유배시켰으니, 이것은 폐방의 형전(刑典)에 있어서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 귀국 공사와 함께 참작하여 공평하게 의논하여 형률대로 징벌 처리하여 영원히 감계(鑑戒)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내 중외(中外)에 널리 유고(諭告)하여 죄다 들어 알도록 했습니다. 이로부터 대화(大和 아주 화목함)에 도달하여 함께 휴복(休福 아름다운 복)을 보전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귀 조정에서도 양찰하시기 바랍니다.
과체는 손톱에 난 생채기를 말하는 것으로 조선 군왕의 미안해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군왕은 군란 책임자의 처벌 내용을 적고 있다. 군란에 참가했던 군졸 30여 명이 참수되고 그 가족들은 유배 또는 지방 관아의 노비로 삼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대원군의 측근들을 일망타진하여 조정에서 내친 것을 말하고 있다. 군란은 대원군 한 사람이 청나라에 잡혀감으로 끝났다. 이 점이 봉건국가의 한계다.
유럽의 시민혁명은 한 사람이 점화를 하면 그 사람이 없어도 불길이 요원으로 번져 온 세상을 태운 특성이 있지만 조선의 봉기는 어느 한 사람의 정치력에 기댄 것이기에 폭발성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박영효는 하늘이 내린 운의 소유자였다. 그는 두번이나 반역사건에 관여하고도 살아남은 전설(?)의 인물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박영효가 가진 친화력 때문이었다. 박영효는 군왕을 비롯한 당시 정치를 구성하고 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과 친했다.
박영효는 군왕을 비롯, 대원군 민비를 가리지 않고 일정한 점수(?)를 얻고 있었다. 박영효는 인간정치에 능했던 듯하다. 그 점은 오히려 김옥균보다 뛰어난 점이었다.
정치는 언제나 공동체가 직면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와 맞닥뜨린다. 정치는 결국 공동체가 살아 남아야 할 방법 내지는 수단인 것이다. 정치를 개인관계로 좁혀 보면 결국 인간관계다. 개화당이라는 구한말의 한 당파의 정치력을 살펴보노라면 당파의 리더였던 김옥균의 이 점이 아쉽기 그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