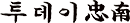"당신은?"
"호호 반갑군요."
"오? 댁이 사신으로 온 것은 아닐 테고...?"
"아뇨. 사신으로 왔네요."
"윤효원의 전갈을 갖고 왔단 말이오?"
홍경래가 오포장에게 자리를 권하며 물었다.
"순무영 중군의 전갈을 제가 갖고 온 거 맞네요. 호호 정말 대단해요."
오포장이 자리에 앉으며 홍경래에게 예의를 표시했다. 전적으로 존경(?)한다는 표정이었다.
"전갈의 내용이 뭐요?"
"그만 투항을 하는 것이 어떨는지요?"
"투항? 그걸 협상이라고 가져온 거요? 댁의 목이 몇개요?"
"호호 목이야 한개뿐이지요. 조건도 있네요."
"조건? 그게 뭐요?"
"반군의 적극 가담자 외에는 죄를 묻지 않는다. 장군, 생각해 보시죠?"
오포장은 홍경래를 장군이라 불렀다. 홍경래는 국군(國軍)에 대항하는 적군의 수장이었고 오포장의 눈에 비친 그는 진정한 장군의 모습이었다.
"하하, 그건 나의 결정사항이 아니요. 전쟁은 지금부터요."
"장군, 많은 사람이 희생 당합니다. 관군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오포장은 관군의 사정을 말했다. 관군은 동계작전의 어려움 속에서 이성을 상실한 지 오래였다.
"백성들을 보호해야할 관군이 오히려 백성들을 도륙하고 있소. 오포장 당신도 사내라면 칼을 들고 나에게 협조를 하시오?"
홍경래는 역으로 오포장을 설득하려 했다. 오포장이 좋은 생각을 갖고 자신을 찾아온 것을 간파한 탓이었다.
"호호, 충과 역은 한끗 차이라더니 역시 안되는군요. 그만 물러가지요."
"내가 순순히 돌려보내 줄 것 같소?"
홍경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오포장을 쏘아보았다. 오포장이 주줌하며 대답을 했다. 조금도 위축된 표정은 아니었다.
"호호, 장군의 청을 하나 들어드리지요.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요."
"오포장 댁은 나와 가는 길은 다르지만 직분에 충실한 사람이고 담대한 사내임도 압니다. 나에게 아까운 아이가 하나 있소이다."
"아들을 말씀하시나요? 그건...."
"아니요. 선아라는 도망친 노비 신분의 아이요."
"아, 그 바둑 잘 두는...?"
"그렇소. 그 아이를 부탁하오. 해줄 수 있겠소?"
오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홍경래의 두 눈에는 여전히 인광이 뚝뚝 떨어졌다. 그 눈 속에 정주성의 최후의 모습이 보였다. 정주성의 마지막 모습은 한반도에 역사공동체가 생긴 이후 가장 비극적인 것이었다. 1812년 4월25일은 이전 5천년 이후 200년간에 가장 참혹한 사건이 일어난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