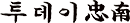[충남투데이 / 이 청 논설위원] 어린날 천자문을 풍월로 얻어 듣던 소년은 28수라는 황도상에 늘어선 별자리를 알았습니다. 28숙의 별자리를 헤아리던 소년은 동리 이발소에서 바둑을 두던 어른들을 어깨 너머로 보며 바둑을 알았습니다.
어린날의 별로 대변되던 꿈은 어른이 되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나 어른들의 어깨 너머로 보았던 바둑은 아직도 오리무중 자체입니다.
꿈은 애초에 포기했지만 바둑은 오랜 친구로 남아 책읽는 탕아(?)를 반겨줍니다.
외로운 날이었습니다.
강변의 모래로 사람을 만들어 대화하고 떨어진 낙엽에 편지를 써 강물에 떠내려 보낸 적도 있습니다. 먼 여행끝에 돌아온 시골집 마당에 쑥대풀이 자라 시절나비들이 날아들었지만 나는 그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강을 끼고 서 있는 산위로 별을 봅니다.
저 별이 지면 나의 님은 답신을 보내시려나. 검은 하늘의 황도를 지나는 28숙을 차례로 헤아리며 나는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강에 침몰한 기억의 편린들이 연서를 보낼 리 없으며 받을 리도 없습니다.
별도 없는 밤이면 혼자서 책을 보고 지치면 바둑판을 내 놓고 돌을 늘어 놓다가 잠이 들면 꿈속에서 금오선생의 고독을 생각합니다.
한구루 배나무에 핀 꽃 고요함을 짝하고/가련토다 달밝은 날을 헛되게 보내누나/ 청년은 외로이 창가에 턱을 괴고 앉아는데/ 어디에 계시나 옥통수 부시는 님은/ 짝잃은 물새 혼자서 날아가고/ 님잃은 원앙은 맑은강에서 노는데/그집에서 만나 바둑 두자던 약조 잊으셨는가/밤마다 창가에서 불꽃점을 친다네/
( 一樹梨花伴寂寥/可憐辜負月明宵/靑年獨臥孤窓畔/何處玉人吹鳳肅/翡翠孤飛不作雙/鴛鴦失侶俗淸江/誰家有約敲碁子/夜卜燈花秋倚/)
새벽이면 구멍난 창호지 사이로 햇살이 들어와 바둑판 위에 멋대로 놓인 흑백의 돌을 눈부시게 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하루는 ‘지천택괘’ 지극히 정밀한 것이 아니면 누가 이 안에 들랴. 이는 오묘한 기국(棋局)의 세계, 바둑을 말하는 겁니다. 바둑을 두는 자는 제 각기나 바둑의 궁극은 끝이 없습니다.
이 무한 광대의 세상이 있기에 세상의 모든 고수와 하수들이 19로 바둑판 위에서 숨을 쉬고 휴식을 취하며 남는 시간을 쪼개어 예도를 논하는 것입니다.
금오 김시습은 당대의 외로운 삶을 이렇게 바둑에 담아내며 살아내고 있습니다.
외롭다는 것, 괴롭다는 것, 선생은 어느세월에 만나 바둑 한판을 둘 수 있을까를 묻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둑은 절대의 수가 있지만 교만이 없어 어떤 고수나 하수들도 가리지 않고 담아내는 사랑으로 저 먼 옛날부터 오늘까지 바둑의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합니다.
고독은 결국 나와 타인의 소통부재와 나와 사회의 소통의 문제일것입니다.
나는 나의 고독을 바둑으로 해결합니다.
오랜 친구이기에 말이 통하고 의미가 통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바둑에 빚이있습니다.
하여 나는 진정한 바둑의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찾지도 아쉬워하지도 않았던 그 노래를 찾아 다시 돌려주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