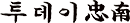밥들고 찾아갔다가 돌아와서는 슬프디 슬프게 혼자 운다네.
(獨婦餉糧還哀哀舍南哭)
고대에 한 여자가 있었다. 광산 부역에 끌고가 진종일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식은 밥 한덩이 주지 않던 관아의 처사는 국가의 횡포다.
부역자들은 옥을 캐는 광산에서 진종일 일하고 지붕도 없는 더불 속에서 잠을 잔 모양이다.
부역자들을 면회하고 온 가족은 절망한다. 주먹밥 한덩이를 만들어 면회를 다녀온 여자의 슬피우는 소리가 천지를 울렸던 모양이다.
위응물(韋應物)이 목도한 이 시(詩)는 천지를 미친 듯 주유하며 돌아갈 귀로마저 잊었다던 대복고(戴復古)의 차디찬 냉기와, 면도칼로 자신의 목을 그어 자결했던 이탁오(李倬悟)의 선혈이 뚝뚝 떨어지는 기상 속을 맴돈다.
독한 언어만이 메시지가 되지는 않는다.
-오십 이전의 나는 정말로 한마리 개에 불과했다. 앞의 개가 그림자를 보고 짖으면 너도 나도 따라 짖어댔다. 누군가가 왜 짖냐고 물어오면 그냥 중의 주문마냥 웃었다.-이탁오.
인간은 누구나 세계 속에 놓여진 자신과 자신 속에서 분열하는 정신세계의 굴절과 대면한다.
세계는 마주치는 자기자신의 자아로 파악되기 마련이다. 개인의 파악은 이미 굴절을 담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개인의 색안경 말이다. 이탁오가 말한 오십 이전의 개였다는 의미는 오만과 편견 그리고 맹목으로 무장했던 자신의 반성문으로 읽힌다.
위응물, 대복고, 이탁오 등은 모두 왜(?)를 묻던 사람들이다.
그림자를 보고 맹목을 외치지 않겠다던 사람들인 것이다.
그만큼 맹목을 벗어나기는 결코 쉽지 않다.
필자도 그 맹목에 빠져 사는 사람이다. 바둑사가 궁금 하다는 가장 단순한 의문에서 시작한 행보가 이제는 너무 멀리(?) 왔다.
산책이 일이 되었다는 것 그것도 부담이다.
면불일기를 보고.
면불은 면천을 말한다. 이 일기는 박시순이 )가 1894년 갑오년에 쓴 일기로 동년 11월13일부터 다음해 6얼27일까지 대략 7개월 분량으로 면천읍성 발굴과 함께 가장 주목되는 자료로 평가 된다.
박시순은 당대의 엘리트로 기록을 무척이나 중요시한 성격을 보여준다.
당시 군수로 부임한 날부터 임실군수로 내려가는 순간까지 면천에 대한 세밀하고 내밀한 기록은 남겨 역사 마니아를 자처하는 필자를 감동시켰다.
일기는 초서로 되어 있고 지명, 호, 전거 등이 난분분하여 내용파악 자체가 힘든 일이었다.
수 십년 한문에 빠져 살았았으면서도 한문은 언제나 함들다.
중언부언 원고 천이백장백자 분량의 일기를 일독 하면서 필자는 많은 공부를 했다.
특히 1894을 앞뒤로 수십년간을 살았던 박시순의 증언으로 동시대를 목도 했고 특히 지역 생활사로 전무하다 시피한 면천과 당진 그리고 덕산 예산등 주변 지방의 사정을 아는데도 도움이 된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