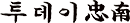바둑이 시작되었다. 열어놓은 여닫이 문 밖의 마당 위로 달빛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방안에는 우군칙과 허낙생이 동원한 두 명의 고수(高手)가 바둑판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고 주변에 우군칙 허낙생 그리고 홍경래와 또 다른 한 사내가 바둑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끄응!”
홍경래는 신음을 토했다. 자신의 반대편에 앉아 똥을 찍어 먹은 표정으로 앉아 있는 사내도 마땅찮은 모양이었다. 그들은 초면이 아니었다. 그자는 의주 ‘채단’의 실질적 패두(佩頭) 김견신(金見信)으로 우군칙과도 아는 사이었다. 우군칙이 그자가 올 것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보아 무엇인가 일이 잘못되고 있는 듯했다.
바둑은 느릿느릿 진행되고 있었다. 흑백 두 점씩을 평거(平去)와 상입(上入)에 놓고 두는 사배자(四配子) 바둑이었다.
“으음….”
홍경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루로 나와 앉았다. 선아가 마루 위에서 세필로 군책(券冊)에 무엇인가를 적고 있었다. 옷을 사줄 때 필기구를 함께 사준 것이다. 허낙생의 집은 백 칸 고대광실이었다. 높다란 담 너머에서 아이들의 노래 소리가 들려 왔다. 선아는 권책 위에 아이들의 노래를 받아 적고 있었다.
백혹흑혹래지(白或黑或來之)
아이유야(我而遊也)
“백화냐?”
“비슷하지만 꼭 백화는 아니에요. 받아 적기가 좋아 써 보는 거에요."
선아가 담 밖의 아이들의 노래를 받아 적은 것은 일종의 백화문(百話文)이라 할 수 있다. 문자(文子)를 알아 말하는 대로 적는 구어체 문자가 백화문이다.
중국은 예로부터 문(文)으로 한문(漢文)을, 어(語)로는 백화문을 사용해 왔다. 문의 한문과 어의 백화는 뚜렷이 구분되어 내려오며 21세기까지 사용된다. 오늘날에도 중국에서조차 전문 학자가 아니면 한문을 모른다.
어(語)로서의 외국어는 문법, 단어, 숙어를 습득하고 이것저것 많은 문장을 읽고 쓰며 배우게 되지만 문(文)의 한문은 결코 습득이 쉽지 않다. 한문은 문법과 숙어 체계 등이 조직적이고 논리적이지 않기에 배우고 사용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한문의 능숙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서와 오경 사기(史記)와 제자서(諸子書) 등을 집중적으로 파 소위 문리를 얻어야 된다. 특유의 고사와 여타 주석이 실로 엄청나기에 그것들을 사전지식으로 확보한 다음에야 비로소 한문을 읽고 쓸 수 있는 것이다.
문언문이라 부르는 고문(古文) 즉, 한문을 아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엄청난 독서 소양이 뒷받침 되어야 하기에 예나 지금이나 한문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다. 한자 몇 자(?) 아는 것은 결코 한문을 아는 것이 아니다. 백화문은 이런 한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또 하나의 어(語)다.
“알록달록 이리와 나하고 놀자? 하하 바둑아 바둑아를 알록달록으로 쓴 거냐?”
홍경래가 선아의 재치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선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
우군칙이 슬며시 마루로 나왔다.
“일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똥 밟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저 인간이 따라올 줄도 전혀 예상 못했구요.”
우군칙의 얼굴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하하, 니가 허낙생에게 보기 좋게 당한 듯하다. 경적필패라 하지 않더냐?”
“아이고 형님, 아직 판은 끝나지 않았잖아요. 저 친구를 믿어 봐야지요.”
우군칙이 데려온 고수는 김밀수(金密壽)라고 했다. 나이는 서른. 하관이 길게 빠진 문약한 인상이었다.
“경래, 요즘 재미가 좋다면서?”
방안에 있던 김견신이 나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담장 밑으로 가 오줌을 싸며 말했다. 큰 키에 발달한 근육이 보기 좋고 거칠고 투박한 사내였다.
서북지역에는 두 개의 연조가 있는 검계(劒契)가 있었다. 의주 채단과 평양에 있는 ‘폐사군단’이었다. 그들 두 단체는 한양의 서강단(西江團)과 함께 조선 암흑가를 삼등분하는 세력이었다.
“어따대고 경래라 하는 거요? 채단은 아래위도 없소?”
우군칙이 소변을 보고 돌아오는 김견신을 보고 짜증을 부렸다. 마당에는 춘대 일행과 김견신을 따라온 채단의 단원들이 순식간에 뒤엉켰다. 마루와 마당 위에는 살기가 돌았다.
“뭐라? 호! 이놈 보소?”
“이놈? 하 이 뼉다귀 보게?”
우군칙이 김견신의 상체에 자신의 몸을 기댔다. 왼손은 상대의 오른쪽 손을 방비하고 바른손은 상대의 허리를 노리는 자세였다. 그 자세에서는 엄지손가락 공격만으로도 상대의 갈비뼈를 몇개 꺾어 놓을 수 있다.
“앉아들? 이게 뭐하는 거야?”
홍경래가 우군칙과 김견신을 마루 위에 앉혔다. 우군칙과 욕을 서로 주고받은 것만으로 상처를 받은 김견신은 울근불근했다. 밖이 소란해도 방안에서는 바둑 두는 소리만이 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