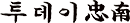책을 읽고 글을 쓴다는 것은 즐거운일이다. 특히 글을 써 남과 공유한다는 것은 인간의 도락(道樂)중 하나다. 하여 글을 쓰는 사람들은 항상 좋은 문장을 생각하며 절치부심한다. 좋은글은 글의 내용과 필자의 진정성이 바탕이지만 문장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문장은 문을 꾸미는 장식이다. 서술의 형식과 장치라 할수 있겠다. 나는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항상 이점이 부족함을 느낀다.
그리고 스스로 부족하니 타인의 문장을 부러워하고 시샘도 한다.
얼마전 ‘시경다시읽기’라는 책을 탈고하며 한 멋지고 알싸한 글을 한편 읽었다.
江涵鷗夢闊
天入雁秋長
표의 문자인 한자의 강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시다. 이유 모를 쓸쓸함과 맑고 유장한 시인의 호흡이 표의 문자의 다의성과 모호성에 녹아들어 이시를 불립문자요 언어도단의 자리인 선의 경지에 올려 놓는다.
이 한시를 우리말로 옮겨 놓기가 두려울 정도다.
이런 시 한편 짓고 죽는다 해도 원은 없을 터이다. 웃기는 일이지만 한번 옮겨 보자. 한자(漢字)만 죽 늘어 놓고 해독을 하지 않는다면 그도 이상한 일일 터이다. 조선 선조 임금 때의 여류 시인 이옥봉의 시다.
강은 갈매기의 꿈까지 품기에 넓고 하늘은 기러기의 슬픔까지 알기에 멀기만 한가.
어떤가. 강과 하늘의 각막함과 쓸쓸함을 단 두줄의 글귀로 다 담아내고도 남는다. 강은 넓고 하늘은 깊거늘 그곳을 나는 갈매기와 기러기까지도 그렇다지 않는가.
이 탁월한 시를 남긴 이옥봉은 전하는 기록이 별로 없다. 다만 허균이 자신의 누이 허난설헌과 비교하던 여류 시인이라는 것밖에는 말이다. 십여 편의 그녀의 다른 시도 전하기는 한다. 이옥봉은 소실의 자식으로 태어나 어떤 양반의 소실로 시집을 가 한평생 시를 벗삼아 신분 사회의 질곡에서 아파하며 살았던 듯하다. 더구나 그녀가 격은 임진왜란은 그녀에게 충격 자체였던듯하다.
반평생 시로 궁했던 팔자
새소리 속에 봄날은 간다.
옥봉은 평생 시경(詩經)을 끼고 산 듯하다.
당대의 문장들에 있어 시경은 이미 경전이 되어 있을 때였다. 자유와 방종을 마음껏 노래하던 시경이 경전의 반열에 들어간 것은 송나라와 명 그리고 조선시대 학자들의 노력 탓이다.
당 시대를 지배하던 성리학적 세계는 성별과 신분 그리고 철저한 윤리로 무장한 사회로 개인의 사유와 생각까지도 엄격하게 제한을 받던 시대였다.
자유한 성의 방종을 노래하던 시경이 음사를 털어내고 국정을 논하는 상소에까지 빈번하게 등장하는 대목은 참으로 사상의 진화다.
‘마치 저 물위에 뜬배가 어디로 다을지 몰라 마음의 시름이여 눈 붙여볼 겨를이 없고나’
이옥봉의 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시경의 이 시편이 율곡 이이의 상소문에 등장한다. 이이는 이 시를 인용하여 승려 보우를 탄핵하는 상소문을 짓고 있다. 사랑에 공허한 여인의 마음을 타인의 죄를 청하는 인용구로 사용하는 조선 선비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이이는 이 시의 쓸쓸하고 허전한 마음을 자신의 마음이라 했다.
성리학의 나라에서 어찌하여 불법이 그리 성하며 왕(명종)이 불법을 두둔하는 이유를 알 길 없다는 상소다. 시경속의 여인의 상심이 자신과 똑같다는 것이다. 시가 노래의 범주를 넘어 사회의
윤기이자 철학으로까지 인식되던 실례인 만큼 조선의 문장들은 시 쓰기를 자랑이자 보람으로 알았었다. 이옥봉은 시인임을 이렇게 긍지로 여기고 있다.
‘ 너의 붓이 떨어지면 바람이 놀라고
나의 시가 이루어지면 귀신도 운다오’ (驚風君筆落.泣鬼我詩成)
숨이 막힌다. 날마다 글을 쓰며 주접을 떨면서 사는것이 괴롭다. 다시 글쓰기를 생각하며 반성한다.
하필경풍의 경지(下筆驚風), 견시곡신의(見詩哭神) 문장은 몰라도 최소한 필자의 논지는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글쓰기를 하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