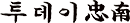“하하 됐다. 그만해라”
“하하, 형님, 이게 물건인데요. 눈치가 보통이 아닙니다”포교가 관모와 상의를 벗으며 홍경래에게 아랫목을 내주며 말했다. 그는 홍총각(洪總角)이었다. 곽산의 염전 상인 출신으로 본명은 홍봉의(洪鳳儀)였다. 관서평란록은 홍총각은 얼굴이 넓고 검으며 수염이 없고 체구가 거구라는 인상착의를 기록하고 있다.홍총각은 활과 쇠도리깨를 잘 쓰는 홍경래부대의 선봉이자 목우산채의 두령이기도 했다.
“선아야 미안하다. 우리 산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한번은 치러야 하는 통과의례다. 우리가 준비가 없기도 했지만 선아 니가 담과 눈치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은 알만하구나. 이제 너를 본 산채로 데려가마”홍경래가 선아의 등을 두드려주며 말했다.
“대장님...!”
“그렇다. 이제 너는 우리 홍경래부대의 단원이다”홍경래가 선아의 손을 잡아 주며 말했다. 방안에 있던 사내들이 모두 박수를 쳐 선아의 입단을 환영했다. 사실 홍경래부대의 입단은 까다롭고 거칠기로 악명이 높았다.
홍경래부대는 조선 각지에 흩어져 활동하는 모든 군도들의 주목 대상이었다. 홍경래부대에 입단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부지기수였다.
서북은 말할 것 없고 경기 충청 양도에서까지 지원자가 몰려왔다.
홍경래부대의 입단을 위해서는 일단 무예가 출중해야 했다. 예외는 산채의 생활에 필요한 특별한 재주가 있는 일부 사람들뿐이었다.
그러나 1차 무예를 검증받은 사람들도 2차 관문에서는 태반이 떨어져 나갔다. 2차 관문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검증을 하는 성분 검열이었다. 일례로 신입 단원을 가짜 기찰에 토포케 하여 산채 상황을 토설케 하는 추국과 고문은 실재를 방불케 하는 끔찍한 것이었다.
죽음의 문턱을 몇번씩 넘나드는 고문의 과정을 함구를 해내야 정식으로 단원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홍경래 부대의 힘이었다.
“그런데 이곳은 어딘지요?”
선아가 홍경래에게 물었다. 문밖은 훤했다. 어느새 날이 밝은 것이다.
“미륵원이란다. 홍총각 너는 산채로 돌아가라”
“그러지요 형님, 얘야 생활 잘 하거라. 다음에 또 보자꾸나”홍총각이 홍경래에게 군례를 올리고 몇 명의 단원을 데리고 사라졌다. 열린 문 저쪽으로 커다란 미륵불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래서 동리 이름이 미륵원인 모양이었다.
“아, 미륵불이시네요?”
“오냐. 저 미륵님이시란다”
홍경래가 미륵불을 바라보며 대답을 했다. 미륵원은 우목산에서 내려오는 작은 하천이 만을 이루며 돌아나가는 부근에 있는 작은 동리였다.
들판 한가운데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를 미륵불이 있어 미륵당이라고도 하는 곳이었다.
홍경래 일행이 아침을 먹는 미륵원은 관용 여관이었다. 고려 시대부터 시작되어 조선 초기에 완성된 역참, 원은 조선 8도 모든 관용 도로상에 있었다. 미륵원은 가산과 박천을 있는 노상에 있었다.
원(院)은 최하급 관원과 관노가 배치되어 공문서를 갖고 통행하는 관원들의 숙식을 제공하는 것이 임무였다. 경비는 약간의 관전(院田)과 일반인의 숙식에서 나오는 경비로 충당되고 있었다.
토란국에 쌀과 조가 섞인 밥을 한대접씩 말아 먹은 홍경래 일행이 다시 길을 잡자마자 홍경래가 장봉사에게 말했다.
“선천으로 가야지?”
“그렇습니다. 오늘이 선천군수의 입향일입니다”
“새로온 군수가 깐간하다며?”
“임금에게 입바른 소리를 하다가 채직된 자라니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자가 관장이어야 정답이지만 우리에겐 좋을 게 없는 자니 각별히 조심해야 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도 선천에 가서 특별히 눈에 띄는 행동을 자제 하도록, 알았나?”
“네이!”홍경래를 앞뒤로 둘러싼 사내들이 목례를 하고는 다시 대열을 나누어 산개를 했다. 선아는 홍경래의 옆을 따르며 포만감에 행복을 느꼈다.
토란국에 조가 섞인 쌀밥을 먹어본 지가 기억에도 가물가물했다.
불식간에 홍경래를 따라 나서기는 했지만 잘못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참 장봉사, 선아가 한문도 알고 장차 희설을 쓰겠다 하니 잘 좀 가르쳐 주게. 선아야 너 한문 어디까지 읽었느냐?”홍경래가 선아의 손을 잡고 걸으며 말했다. 그 손이 따뜻하고 포근했다. 아버지의 손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의 손이었으나 선아는 그 손이 좋았다.
“시경까지 읽었습니다”
“뭐라고? 시경?”
홍경래와 장봉사가 비명을 지르듯 합창을 했다.
“네”
선아가 똑 부러지게 답을 했다. 언제라도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느껴졌다.
“오, 사대부의 자식이라더니... 그럼 다음 싯구를 연결해 보거라”
장봉사가 시 한 수를 읊었다. 조선의 식자라면 시경 속의 시 3백 편을 암송하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