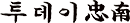“호?” “작”
호작(好昨), 어제는 좋았다는 뜻의 군호가 교환되자 수풀 속에서 강궁에 화살을 먹인 초병(哨兵) 두 명이 걸어 나와 홍경래를 알아보고 군례를 올렸다.
“노고가 많다. 수고들 해”
홍경래는 경계병들을 격려하고 산곡으로 행군을 계속했다. 산채는 계지천으로 또 다른 물기기를 한줄 내보내는 작은 계곡의 끝쯤에 있었다.고거 고성(古城)이라 부르던 성터가 있는 곳에 여러 채의 토벽집을 지어 놓은 은밀성이 뛰어난 장소였다.
“뻐꾹, 뻐꾹... 뻐뻐꾹!”
초병들이 산채로 날리는 신호가 마치 진짜로 산중 뻐꾸기가 우는 소리 같았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 있었다. 산채는 조용했다. 목우산은 동림산 향적산으로 이어지는 묘향정맥과 적유정맥이 등과 허리를 스치고 지난 지역인지라 대낮에도 호랑이가 출몰할 정도의 험지로 기백명의 부대가 모여 살기에 적합한 장소였다.
특히 산중에는 고성이 있었고 계곡물과 여기저기서 나오는 샘이 있어 고립 작전이 가능한 곳이었다.
더구나 목우산은 그리 높지 않은 산인데도 정상에서 보이는 조망(照望)이 탁월했다. 서쪽으로 정주(定州)와 안주 평야는 물론 멀리 서해가 보이고 남북으로 연결된 역참로와 북관에서 평양으로 내려가는 봉수 등이 모두 포착되는 요지였다.
목우산채는 망루와 다섯 칸 크기의 숙소가 두 곳에 있고 곡식 창고와 무기고가 석축과 목책으로 둘러싸여 군사보(堡)를 방불할 정도였다. 작은 인원으로는 포위할 수 없고 작은 인원으로 능히 대군도 맞아 싸울 수 있는 험지의 산채는 작은 불빛도 새어 나오지 않았다.
“까악. 까악!”
산새가 울었다. 선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불식간에 홍경래를 만나 따라오기는 했지만 그것이 잘한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생각났다. 졸수(拙樹) 유치용이 선아의 아버지였다. 졸수는 올곧은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임금에 간언을 하다가 역도(逆徒)로 다스려진 사람이었다.
선아는 임금에게 말을 잘못했다 하여 그것이 역도가 되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숙소 들창으로 성근별이 반짝거렸다. 숙소 안에 사내들의 땀 냄새가 진동했다.
“덜컹!” “어머?”
숙소의 문이 열리고 바람같은 사내들이 뛰어들어와 선아의 입을 수건으로 틀어막고는 커다란 자루 속에 선아를 집어넣고 어깨위에 달랑 둘러메고 산길을 나는 듯 내려갔다.
선아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관노를 벗어나 군도의 일원이 되는가싶더니 전혀 엉뚱한 일이 닥치고 있지 않은가. 숨이 막혀왔다. 억센 사내의 어깨위에 걸린 아랫배가 저려왔다. 소변이 마려울 정도였다. 그때 말소리가 들렸다.
“보자기를 풀고 입도 풀어 줘라”
“... ...?”
선아는 어떤 방에 잡혀와 있었다.
선아를 들쳐 업고 온 사람들은 모두 평복 차림이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포교복을 입은 사내가 앉아 있었다. 굵은 심지가 박힌 초롱불이 가물가물했다.
“니가 감히 관노의 신분으로 도망을 하여 군도의 산채에 들어갔단 말이지? 관아의 추쇄가 무섭지도 않더냐?”
“관아에서 어찌?”
“하하. 어떻게 그렇게 바르게 너를 잡아냈는지 그게 궁금하냐? 홍경래의 산채에도 우리의 봉수가 박혀 있느니라. 얘야 너 살고 싶지 않느냐?"
포교가 수염을 한손으로 쓸어내리며 물었다. 말투가 사납지는 않았다. 대역죄에 연좌된 관노가 도망을 하다 잡히면 물고(勿告: 맞아 죽음)를 당하는 것이 다반사였다.
“살 수 있는 길이 있는지요?”
선아는 정신을 차리려 단전에 힘을 주었다. 입안이 바싹 타올랐다.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 같았다. 선아는 오직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만이 뇌리를 스쳤다.
‘얘야 정신만은 놓지 말거라. 그것만이 너를 지켜 줄 수 있단다’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금오(의금부)의 순옥에서 마지막 본 아버지였다. 집안의 남자들은 모두 죽었고 여자들은 천지사방으로 흩어져 관노로 나가기 직전에 아버지가 한 말이었다.
“너를 다시 산채로 보내줄 테니 우리의 봉수 노릇을 할 테냐?"
봉수(峰燧)는 정보원을 말하는 것이었다. 산채로 돌아가 관아의 정보원 노릇을 하라는 말에 선아는 손끝이 떨렸다.
“... ...?”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포교는 산채에 박혀 있는 봉수의 정보로 자신을 잡아왔다고 했다. 그리고 다시 자신에게 산채의 봉수로 박혀 달라는 요구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때서야 선아는 웃음이 나왔다.
포교의 복장이 어색했다. 관아 생활 5년 동안 눈치코치로 살아온 선아였다. 대부분 온갖 멋을 부리는 포교들의 복장과는 동떨어진 모습이 그랬다.
“협조를 하겠느냐?”
“하라면 해야지요. 그런데 포교와 기찰들이 맞긴 맞는지요?"
“뭐라고?”
“어디 소속의 기찰들이신지요? 서북 양영에서 제가 모르는 기찰은 없는데요?”
양영(兩營)은 서북의 두 곳 거점인 의주와 안주를 말하는 것이다. 선아는 관아의 노비 생활을 통해 평안도 42관의 정보를 조금은 알고 있었다.
“관찰사 소속이다. 관찰사 계신 곳 말이다. 우리들은 평양에서 왔다”
“한양 포도청이 아니고요?”
“포도청? 아니 이것이 정말...?”
포교는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몇 명이 더 들어왔다.
< 다음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