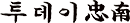홍경래는 대웅전 안으로 선아를 데리고 들어가 다시 말을 이었다.
“하하, 내가 관찰사보다 힘이 세다는 말은 다 헛소문이란다. 너의 말대로 구름일 뿐이지. 산채에 들어오고 싶다고 했느냐?”
“네. 데려가 주실 수 있는지요?”
“관노 생활보다 쉬울 수는 있을 게다. 그러나 얘야. 산채라는 곳은 기분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란다. 어둠의 자식들이 결사로 동아줄을 매고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이다” “결사의 동아줄이라고요?”
“그렇단다. 너 같은 소녀에겐 어려운 말이지” “산채에 여자들은 없나요?” “왜 없겠느냐? 밥하고 빨래하고 때로는 활을 들고 싸움도 하는 동지로 여자들도 산단다” "동지라고요?” “오냐. 동지지 마음이 같다는 뜻이란다” “그럼 저도 동지가 될 수 있겠네요?"
홍경래는 결사(結死)의 동아줄을 말했다. 동아줄은 동맹(同盟)을 말한다. 죽기로 한 무리를 이룬다는 의미기도 하다.
동지(同志)는 동맹의 구성원이다. 조선의 군도들은 서로를 동갑(同甲)이라 했다. 연산조 때의 홍길동이나 선조 때의 이몽학 등이 동갑계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았었다.
“하하, 각오가 있는 게구나. 그래 선아 너는 무엇을 할 줄 아느냐?”
"장기 말인가요?" “그래 장기 말이다. 산채에는 재주꾼들이 많단다. 칼쓰기 활쏘기 말타기 등등 말이다”
“글쎄요... 구름을 지을 줄 아는 것도 장기가 될까요?” “구름을 지을 수 있다...? 하하 좋다. 그것도 훌룡한 장기이지. 춘대야?” “부르셨는지요?”
홍경래의 나지막한 부름에 법당 뒤편에서 그림자 하나가 나와 섰다. 건장한 몸에 보자기에 싼 장검을 들고 있었다.
“이 아이를 산채로 데려간다. 활빈의 재목으로 키우자” “마님에게 말씀을 안드려도 되겠는지요?”
선아가 홍경래의 말에 기쁨과 두려움을 한꺼번에 표현했다. 그것은 홍경래 산채의 일원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법을 어기는 것이기도 했다. 조선의 국법은 결코 관노비의 피면(避眠)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 없다. 춘대는 선아를 돌보거라”
홍경래는 선아를 춘대에게 맡기고 약사전으로 내려갔다. 약사불은 세양식(洗陽式)이 끝나고 부장품이 넣어진 채 제자리에 모셔져 있었다.
학무가 홍경래를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라 손짓을 했다.
“다 끝났군요?” “홍거사 앉으시요. 차나 한잔 합시다”
홍경래가 학무의 방인 설선당의 마루 위에 걸터앉으며 경내를 둘러보았다. 십여 명의 여자 불자들이 설선당과 약사전 사이에 임시로 설치한 채알 속에서 공양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불자들 대부분이 홍경래를 알고 있었다. 서북에 홍장군 있다는 말이 서북지방을 넘어 한양 경내에까지 퍼져 있을 정도였다. 사람들은 홍경래 부대가 조만간 어떤 일을 낼 것이라 수군대고 있었다.
“홍거사 인사나 드리시오. 이 분이 본관 사또의 부인이시라오”
홍경래는 방안에 또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쪽빛 상의에 붉은 치마를 입은 여인으로 마흔쯤 되어 보였다.
“그러신지요?”
홍경래가 여인에게 목례를 하고는 훌쩍 방안으로 들어가 학무에게 차를 청했다. 학무가 한가한 웃음을 지으며 다완(茶宛) 하나를 마른 수건으로 씻어 홍경래 앞에 내놓았다.
“홍첨지님 고명은 많이 들었지요. 모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사또 부인이 홍경래에게 말을 걸어 왔다. 당돌한 여자였다.
“첨지라니오?”
홍경래가 다완을 들어 입가에 대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첨지는 3품관 무관을 말하는 직책으로 장군의 반열이다. 미색 속에 묘한 독기를 담고 있는 여자였다.
“호호, 안주 의주의 양 목사와 42관 관장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분이신데 첨지가 대수겠는지오? 백성들까지 모두 홍첨지라 부르는데요”
“끄응”
홍경래는 함경도 42관까지 들먹이며 너스레를 떠는 여인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는 차 한잔을 훌훌 입안에 털어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왜 벌써 가시려고?” “스님, 저는 이만 물러나야겠습니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 산을 넘어야 하니까요”
홍경래가 학무에게 인사를 하고 설선당을 나섰다.
그와 함께 사방에 흩어져 있던 십여 명의 사내들이 마당 한쪽에 도열했다. 모두 보자기에 싼 각종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자 다들 부처님의 가피가 계시기를...”
홍경래가 절안의 사람들에게 합장을 하고 양화사를 나섰다. 평상시에는 사람 구경하기 힘든 곳이었다.
“어디로 길을 잡을까요?”
홍경래의 옆에 바짝 붙은 장봉사가 말했다. 그는 철산에 살던 아전 출신으로 신분에 어울리지 않게 상당한 한학 실력과 육도삼략이나 기효신서 같은 병법을 탐독하다가 홍경래 부대에 들어와 모사를 맡고 있었다.
“목우산채로 가자” “거긴 어제 들렀지 않습니까?” “장봉사가 말하지 않았나? 만천과해 말이야” “아하! 역시 장군이십니다. 자 목우산채로 길을 잡으라신다”
장봉사가 따르는 무리들에 지시를 내렸다. 10명의 대원이 순식간에 3개조를 나뉘어 척후, 후군 그리고 홍경래와 장봉사가 있는 중군을 형성, 척후와 후군의 거리 5백 보를 유지하며 행군 대오를 유지했다.
춘대는 말 두 필의 고삐를 잡고 있었다. 말잔등 위에는 천으로 덮인 활과 화살 한 통이 있었다. 선아는 후군을 유지하는 대원이 등에 업고 있었다.
“저 아이를 어쩌시려고요?”
행군 중에 장봉사가 물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빨랐다. 하룻밤에 안주, 의주 두개 관을 왕래하는 걸음들이었다.
“거두자. 저 아이도 한이 있다. 좋은 동지가 될 수 있겠어”
“그렇다고 무작정 산채로 들이기에는...?”
“근기는 살펴야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여우같은 년 평판이 아주 안 좋던데요”
홍경래가 계지천(係之川)을 따라 목우(牧牛) 산채로 향하면서 물었다. 목우산채는 목우산(牧牛山) 안에 있었다. 목우산은 정주와 가산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꼴을 먹는 소의 형상을 닮았다 하여 붙은 이름이었다. <다음편 계속>